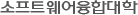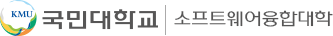국민인! 국민인!!
[책과길] 시집 ‘바이칼 키스’ 낸 신대철…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리워한 곳 / 문예창작대학원 교수
- 07.05.11 / 조영문

 |
|
“우리 몸속 어딘가에 바이칼 숨결이 흐르고 있었던가요? 바이칼이 우리 영혼의 이름이었던가요? 물살이 스치기만 해도 가슴까지 수심이 차올랐습니다.”(‘바이칼’ 일부)
신대철(62) 시인이 네번째 시집 ‘바이칼 키스’(문학과지성사)를 냈다. 표지를 장식한 파란 바탕이 바이칼 호수에서 뚝 떼어져 나온 푸른 물굽이처럼 아스라하다. ‘바이칼 그린’이라고 명명하고픈 색깔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은총 같은 호수 바이칼. 어떤 은총이 필요했길래 시인은 바이칼에 몸을 적셔야만 했을까.
시인은 어린 시절 화전민으로 살았고, 청년시절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를 피해 남한 공작원을 북파시키는 장교로 복무했으며 실미도에서도 교관 생활을 했다. 말하자면 그의 몸에는 우리 현대사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치명적인 체험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휴전선에서 지뢰를 밟고 산화한 병사의 시신을 수습하던 피묻은 손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한 영역이었으리라.
23년의 절필끝에 그는 2000년 시집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와 2005년 '그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대를 사랑한다'를 펴내며 자신의 몸속에서 들끓던 용암을 쏟아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방에서 입었던 정신적 내상은 두 시집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된 듯 보였다. 그리고선 바이칼로 나아갔다.
국민대 문예창작대학원 교수인 그는 근년들어 안식년을 이용해 몽골에서 1년, 알래스카에서 반년을 홀로 살았다. 몽골 초원과 바이칼을 오가며 사는 동안 시인은 역사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풍경속에 놓이는 극적인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오롯이 시로 완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칼 소년이 빛을 등지고 웃고 있다. 엊저녁 꺼져가는 난로 속에 통나무를 세우고 매운 연기 속에 후우우 바람을 불어 넣던 소년, 불 피운 뒤에도 밤늦도록 불가에 앉아 가슴 깊이 불기운을 들이마시던 소년//(중략) 바이칼 소년은 웃다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 여백에 박혀 있고 나는 떠돌이 이웃들처럼 자리를 뜬다. 번쩍 소년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간다."('바이칼 소년' 일부)
시인은 바이칼 소년에게서 생의 원점을 읽어낸다. 그 원점이란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오고/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리워 한 곳"('바이칼')이다. 이번 시집은 바이칼 뿐 아니라 알래스카, 시베리아, 몽골의 초원, 백두산과 두만강 등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황야에 살아 있는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절규였다. 나는 절규와 먼지 사이에서 인간적인 것 일체를 버리려고 숨죽이고 살았다. 밤공기를 뒤흔드는 늑대 울음 소리, 울부짖는 별빛, 그 뒤에 불어오는 숨 막히는 허공.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푸른 고독속으로 바이칼 물소리가 울려왔다."('시인의 말')
그의 예전 시에서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난 도스토예프스키의 발목에 걸린 쇠고랑 소리가 들렸다면 이번 시편들은 상처받은 역사의 쇠고랑을 벗겨내고 바이칼 푸른 물에 발을 씻는 소리가 들린다.
출처 : 국민일보 2007.05.11 17:10
원문보기 : 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533935&cp=nv
| [책과길] 시집 ‘바이칼 키스’ 낸 신대철…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리워한 곳 / 문예창작대학원 교수 | |||||||
|---|---|---|---|---|---|---|---|
|
신대철(62) 시인이 네번째 시집 ‘바이칼 키스’(문학과지성사)를 냈다. 표지를 장식한 파란 바탕이 바이칼 호수에서 뚝 떼어져 나온 푸른 물굽이처럼 아스라하다. ‘바이칼 그린’이라고 명명하고픈 색깔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은총 같은 호수 바이칼. 어떤 은총이 필요했길래 시인은 바이칼에 몸을 적셔야만 했을까. 시인은 어린 시절 화전민으로 살았고, 청년시절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를 피해 남한 공작원을 북파시키는 장교로 복무했으며 실미도에서도 교관 생활을 했다. 말하자면 그의 몸에는 우리 현대사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치명적인 체험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휴전선에서 지뢰를 밟고 산화한 병사의 시신을 수습하던 피묻은 손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한 영역이었으리라. 23년의 절필끝에 그는 2000년 시집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와 2005년 '그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대를 사랑한다'를 펴내며 자신의 몸속에서 들끓던 용암을 쏟아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방에서 입었던 정신적 내상은 두 시집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된 듯 보였다. 그리고선 바이칼로 나아갔다. 국민대 문예창작대학원 교수인 그는 근년들어 안식년을 이용해 몽골에서 1년, 알래스카에서 반년을 홀로 살았다. 몽골 초원과 바이칼을 오가며 사는 동안 시인은 역사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풍경속에 놓이는 극적인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오롯이 시로 완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칼 소년이 빛을 등지고 웃고 있다. 엊저녁 꺼져가는 난로 속에 통나무를 세우고 매운 연기 속에 후우우 바람을 불어 넣던 소년, 불 피운 뒤에도 밤늦도록 불가에 앉아 가슴 깊이 불기운을 들이마시던 소년//(중략) 바이칼 소년은 웃다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 여백에 박혀 있고 나는 떠돌이 이웃들처럼 자리를 뜬다. 번쩍 소년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간다."('바이칼 소년' 일부) 시인은 바이칼 소년에게서 생의 원점을 읽어낸다. 그 원점이란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오고/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리워 한 곳"('바이칼')이다. 이번 시집은 바이칼 뿐 아니라 알래스카, 시베리아, 몽골의 초원, 백두산과 두만강 등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황야에 살아 있는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절규였다. 나는 절규와 먼지 사이에서 인간적인 것 일체를 버리려고 숨죽이고 살았다. 밤공기를 뒤흔드는 늑대 울음 소리, 울부짖는 별빛, 그 뒤에 불어오는 숨 막히는 허공.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푸른 고독속으로 바이칼 물소리가 울려왔다."('시인의 말') 그의 예전 시에서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난 도스토예프스키의 발목에 걸린 쇠고랑 소리가 들렸다면 이번 시편들은 상처받은 역사의 쇠고랑을 벗겨내고 바이칼 푸른 물에 발을 씻는 소리가 들린다. 출처 : 국민일보 2007.05.11 17:10 |
|||||||
| 이전글 | 실직후 나홀로 끙끙 금물…재취업센터서 희망 찾았죠" / 곽용근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03) 동문 |
|---|---|
| 다음글 | 백기복 교수 한국인사조직학회 제18대 회장에 피선 / (경영) |